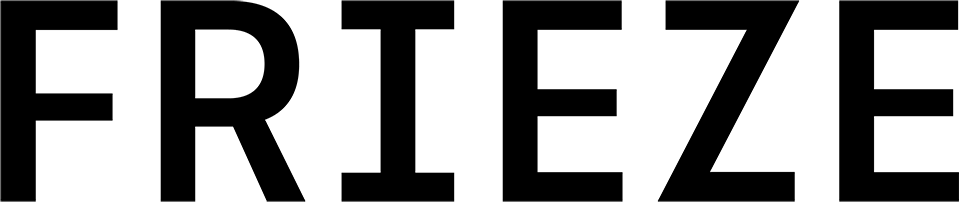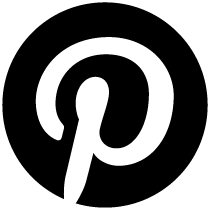부산비엔날레에서 바라본 부산항
화려한 차이나타운부터 초량재, 영주맨션까지 정하영은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매력을 드러내는 부산의 다섯 공간을 소개한다. 항구 도시 부산의 매력적인 역사와 풍경을 아우른다.
화려한 차이나타운부터 초량재, 영주맨션까지 정하영은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매력을 드러내는 부산의 다섯 공간을 소개한다. 항구 도시 부산의 매력적인 역사와 풍경을 아우른다.

무더운 여름, 나는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싣곤 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을 분주히 적재하는 항구,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가 가득한 수산시장, 형형색색의 파라솔들이 늘어선 해운대가 그곳에서 나를 맞이했다. 그러나 부산의 참모습은 어둠이 내린 후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밤바다의 수평선에서 반짝이는 고깃배들, 백사장 조명 아래 여행객, 현지인 할 것 없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광경. 이렇게 ‘살아있는’ 부산은 내 마음을 늘 일렁거리게 했다.
1981년 현지 예술가들의 주도로 움튼 부산비엔날레가 올해 내건 제목은 《어둠에서 보기》이다. 유럽 계몽주의에서 빛과 가시성은 깨달음과 동일시되었고, 어둠은 쫓아내야 할 대상에 그쳤다. 이번 부산비엔날레2024의 공동전시감독인 베라 메이(Vera May)와 필립 피로트(Philippe Pirotte)는 어둠을 그 깊이만큼 포용적인 대안의 공간으로 상정하며 이러한 통념을 뒤엎는다.
메이는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이어졌던 사전 조사를 회상하며 말했다. “부산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오가며 무역하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부산은 한국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러시아어와 카자흐어가 적힌 간판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차이나타운의 풍경처럼, 부산 곳곳에서 그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규범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해적 계몽주의’라는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해적 계몽주의는 미국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가 제안한 개념으로, 국가나 거대 자본의 권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초기 해적 사회를 참조한다. 공동 전시 감독은 해적들의 고유한 의사결정 방식에 주목해 이번 비엔날레 기획의 개념적 근간을 다진다. ‘문화나 피부색과 무관하게’ 가장 뛰어난 해적들 간의 협상과 회합으로 뜻을 정하는 그들의 방식 말이다.
또한 ‘수도승의 깨달음’은 메이가 “불교가 일본으로 전파된 경로”라 묘사한, 부산이 가진 역사적 역할에 착안하여 올해 비엔날레의 또 다른 축을 이룬다. 대안 공동체 내에서 수도승은 주기적으로 규율과 공동 재산에 대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특정 장소에 귀속되지 않는 자아”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는 이민자, 난민, 프롤레타리아 반군, 중퇴자, 혹은 해적과 다름없다. 사뭇 이질적인 해적과 불교라는 단어는 부산에서 조우하며 짙은 어둠 속에서 조화와 깨달음에 이른다.
그렇다면 전시감독 메이와 피로트는 부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부산이 지닌 다채로움이라는 유산을 이어가고자 그들은 오클랜드 출신의 존 베아(John Vea), 가나 출신의 트레이시 나 코시 톰슨(Tracy Naa Koshie Thompson) 등 한국에서 쉽사리 접하기 힘들었던 작가들을 소개한다. 또한, 통도사에서 수십 년간 전통 불교미술을 전승해 온 온 송천 스님을 포함한 현지 작가들의 참여는 이번 비엔날레에 지역적 특색을 더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주 무대인 부산현대미술관뿐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부산을 담기 위해 도시 곳곳의 특별 전시 공간들을 활용했다. 전시 기획에 영감을 준 다음 장소를 거닐며 올해 비엔날레의 규모와 정신, 무엇보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부산의 진면모를 들여다보자.
초량재 (부산특별시 동구 초량상로 117-8)
초량은 부산역이 자리한 동네의 옛 지명으로, ‘풀밭의 길목’을 의미한다. 육지와 바다를 잇는 교통의 요지인 초량은 과거 드넓은 초원이었다. 이후 조선시대 일본인의 거점으로 교역의 중심이 되었으며 개발을 거쳐 현재의 부산역으로 변모했다. 부산역 뒤편 산자락에 1960년대 지어진, 선박 형태를 띤 이 2층 양옥은 당시 집주인이 해양 도시 부산의 주 산업에 종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인상적인 건축물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전시 공간으로 처음 탈바꿈한다.
범어사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부산 지역 사찰의 역사를 조사하던 메이와 피로트를 사로잡은 금빛 물고기의 전설이 전해지는 범어사는, 비엔날레가 제시하는 담론에 수도승의 삶의 방식을 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6세기 한 지리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범어가 우물에서 놀았다는 전설에서 금정산의 이름을 따왔으며 범어사 또한 건립되었다고 기록한다. 수차례의 화재와 복원 후에도 3층 석탑과 건물의 기단 등 석조 부분에 남아있는 7세기 창건 당시의 흔적은 불교 역사에서 여전히 중추적인 부산의 역할을 상상케 한다.
영주맨션 (부산특별시 중구 영조길 51 9다동, B1, #5)
영주맨션은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따라 올라야 비로소 그 입구에 닿는다. 열 평 남짓한 이 예술 공간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후반 공공 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 건물의 지하에 있다. 2008년 세 명의 여성 작가 및 큐레이터가 다시 숨을 불어넣은 이후, 영주맨션은 소외된 예술가들을 활발히 소개하는 장소로 거듭났다. 메이는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서사를 담는 이들의 전시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간의 장소성에도 매료되었다 회고한다. 부산에서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은 전통적으로 생산직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주거지였는데, 배가 들어오는 대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항구로 달려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메이는 “이러한 관점과 시선이 미술 감상 그리고 이 도시 노동자의 역사를 고려하는 태도로 이어지는지에 주목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자갈치 시장 (부산특별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부산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식당을 묻는 질문에 메이는 주저 없이 수산 시장을 꼽았다. “시장에서 식사하고, 부산 시민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경험이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라며 말이다. 오늘날 500여 개 점포가 성행하고 있는 자갈치 시장은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내려온 피난민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을 파는 노점을 연 데서 유래되었다. 마치 예전 그 모습처럼 상인들의 나무 좌판이 늘어선 이곳에서 갓 잡아 올린 제철 해산물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차이나타운
19세기 청나라 조계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차이나타운은 20세기 전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주해 온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한때 중국 영사관이 자리하기도 했지만 화교 인구가 점차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변화를 거듭하며 현재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이주민의 터전이 되었다. 홍등과 중앙 아치문, 각기 다른 중앙아시아 언어로 적힌 간판과 이국적인 음식들은 마치 상상 속 고대 중국 도시를 연상시킨다. (박찬욱 감독의 2003년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이 만두를 먹었던 ‘장성향’을 빼놓을 수 없다.) 이방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존재로 거듭나는 곳, 그곳이 바로 차이나타운이다.
본 기고글은 ‘Ports of Entry’이라는 제목 아래 프리즈 서울 2024의 공식 간행물 『프리즈 위크(Frieze Week)』에 실렸다. 번역: 류다연
추가 정보
프리즈 서울, 코엑스, 2024년 9월 4일 – 7일.
프리즈 서울 티켓은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프리즈 멤버십 가입을 통해 아트페어에 대한 특별 액세스, 멀티데이 입장, 멤버 전용 가이드 투어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프리즈 뷰잉 룸(Frieze Viewing Room)은 아트페어 개최 일주일 전에 공개되며, 관람객들이 프리즈 서울을 온라인으로 선 관람하고 원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프리즈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은 프리즈 공식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 및 frieze.com에서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메인 이미지: 방정아, 〈미국, 그의 한결같은 태도〉, 2021. 제공: 부산 비엔날레